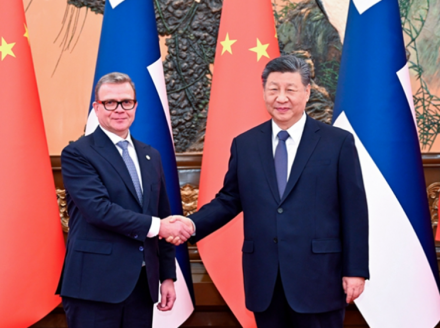글|화영
해외에서 중국을 바라보는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종종 비슷한 의문이 제기된다.
남북으로 3000km에 달하는 광대한 영토, 영하 50도에서 영상 20도를 오가는 극단적인 기후, 서로 알아듣기 힘든 방언과 전혀 다른 음식 문화까지. 이처럼 차이가 극심한데도 중국인들은 자신을 한결같이 “중국인”이라고 규정한다는 점이다.
유럽은 상대적으로 좁은 면적임에도 불구하고 40여 개 국가로 나뉘었다. 반면 중국은 수천 년에 걸쳐 통일 국가의 틀을 유지해왔다. 이 현상은 서구의 정치·사회학 교과서에서도 꾸준히 분석 대상이지만, 서구식 ‘민족국가’ 개념만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 ‘중국인’이라는 정체성은 단순한 국적이나 행정 단위가 아니라, 오랜 시간 축적된 문명적 합의에 가깝기 때문이다.

유럽이었다면 수십 개 국가로 갈라졌을 차이
중국은 헤이룽장에서 하이난까지 이어지며 언어·생활 방식·식문화의 차이가 극심하다. 이를 유럽에 대입한다면 수십 개의 독립 국가가 생겨났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영국과 아일랜드는 좁은 해협 하나를 사이에 두고 수백 년을 함께했지만, 민족과 종교의 차이를 이유로 결국 분리됐다.
벨기에는 국토가 작음에도 불어권과 네덜란드어권의 갈등이 반복되고 있고, 발칸반도는 유고슬라비아 해체 이후 단기간에 여러 국가로 쪼개졌다. 서구 사회학 이론의 틀에서 보자면, 이 같은 지역·언어·문화적 차이는 분열로 이어지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
유럽의 통합은 대체로 혈통과 종교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게르만과 슬라브, 가톨릭과 개신교 사이의 경계는 제국 붕괴 이후 재통합을 가로막는 요인이 됐다. 로마제국도, 오스만제국도 해체된 뒤 다시 하나의 정치 공동체로 복원되지 못했다.
“집은 하나여야 한다”는 오래된 인식
그러나 중국은 달랐다. 5000년에 걸친 역사 속에서 이 땅의 사람들은 “집은 하나여야 한다”는 인식을 집요하게 유지해왔다. 쌀을 주식으로 하든, 밀을 먹고 살든, 눈이 내리든 비가 오든, 자신의 뿌리를 묻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놀라울 만큼 유사하다. 해외에서 여러 세대를 거친 화교 사회에서도 이러한 정체성은 쉽게 희미해지지 않는다.
이 강한 결속력의 기원은 진시황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기원전 221년 진의 통일은 단순한 영토 확장이 아니라, 문명 운영체제를 하나로 묶는 작업이었다.
‘차동궤’와 ‘서동문’, 문명 네트워크의 표준화
진시황이 시행한 ‘차동궤(車同軌)’는 행정 개혁을 넘어 경제·교통 네트워크를 통합한 조치였다. 각국마다 달랐던 수레의 규격을 통일함으로써 사람과 물자의 이동을 하나의 공용 체계로 묶었다.
더 결정적인 조치는 ‘서동문(書同文)’이었다. 지역마다 말은 달라도 글은 통한다는 원칙이다. 한자는 시대에 따라 형태가 변했지만, 공통된 기호 체계는 유지됐다. 문자라는 통합 장치가 문명의 골격 역할을 한 셈이다.
이 덕분에 중국인들은 같은 <사기>를 읽고, “풍소소혜 역수한(風蕭蕭兮 易水寒)”과 같은 문장을 함께 기억해 왔다. 반면 로마제국 해체 이후 유럽에서는 라틴어가 분화되며 언어와 역사 인식이 동시에 갈라졌다.
과거 시험, 계층을 잇는 사회적 혈관
문자가 문명의 골격이라면, 수·당 이후 확립된 과거제는 사회를 순환시키는 혈관이었다. 서구 중세 사회에서 신분은 혈통에 의해 고정됐지만, 중국에서는 시험을 통해 상향 이동이 가능했다.
쌀죽으로 연명하던 소년 범중엄, 지방 출신에서 권력의 정점에 오른 장거정, 여섯 번의 실패 끝에 벼슬길에 오른 증국번의 사례는 이 제도의 상징이다.
1300년 넘게 지속된 과거제는 전국의 지식인층이 같은 경전과 가치관을 공유하도록 만들었고, 지역 간 차이를 문화적 동질성 속으로 흡수했다.
혈통보다 중요한 ‘문명에의 귀속’
중국의 ‘천하(天下)’ 개념은 배타적인 민족국가 개념과는 다르다. 기준은 혈통이 아니라 문명에 대한 동의다. 공자 이후 정립된 “이적이 중국에 들어오면 중국이 된다”는 인식은 왕조 교체기마다 반복적으로 작동했다.
북위의 선비족, 금의 여진족, 원의 몽골족, 청의 만주족까지—그들은 무력으로 중원을 장악했지만, 통치를 위해 결국 한자와 유교 질서에 편입됐다. 강희제와 건륭제가 방대한 한문 고전을 집대성한 것 역시 이러한 ‘문명 귀속’의 결과였다.
근대적 시련과 ‘통일의 회복’
근대 이후의 격변 속에서도 ‘통일의 이상’은 끊기지 않았다. 청 말의 분열, 서구 열강의 침략, 군벌 시대의 혼란은 중국 역사 전체로 보면 오히려 예외적인 시기였다. 헨리 키신저가 이를 “중국 문명의 일시적 중단”으로 표현한 것도 이 때문이다. ‘새로운 국가의 탄생’이라기보다, 무너졌던 통일 질서의 회복, 즉 ‘부흥(復興)’으로 인식돼 왔다.
차이는 있어도, 정체성은 하나
동북에서 된장을 즐기는 사람과 광둥에서 냉차를 마시는 사람이 서로를 같은 공동체로 인식하는 이유는 피부색이나 억양, 정치 제도 때문이 아니다.
진나라의 달빛, 한나라의 관문, 세대를 넘어 함께 읽고 외운 시와 문장, 그리고 ‘천하’라는 집단적 상상력이 그 뿌리를 이룬다.
중국을 하나로 묶어온 힘은 군사력이나 종교가 아니라, 언제든 다시 작동할 수 있는 문명 시스템이었다. 바로 이 점이 유럽의 분열과 중국의 지속적 통합을 가르는 가장 근본적인 차이이자, 오늘날 동아시아 질서를 이해하는 데 여전히 유효한 열쇠다.
BEST 뉴스
-

사료 왜곡 논란 부른 《태평년》의 ‘견양례’
글|안대주 최근 중국에서 개봉한 고장(古裝) 역사 대작 드라마 《태평년》이 고대 항복 의식인 ‘견양례(牵羊礼)’를 파격적으로 영상화하면서 중국 온라인을 중심으로 거센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여성의 신체 노출과 굴욕을 암시하는 연출, 극단적인 참상 묘사는 “역사적 사실을 넘어선 과도한 각색”... -

중국의 도발, 일본의 침묵… 결승전은 반전의 무대가 될까
“일본은 코너킥으로만 득점한다.” “선수들은 어리고, 쓸모없다.” “일본은 이미 끝났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 말이 사실이라면 좋겠지만, 문제는 축구가 언제나 말과 반대로 흘러왔다는 점이다. 이런 발언은 종종 상대를 무너뜨리기보다, 잠자고 있던 본능을 깨운다. 이쯤 되면 묻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은, 괜... -
![[기획 연재 ④] 총과 권력이 만든 성의 무법지대](/data/news/202601/news_1769224829.1.png)
[기획 연재 ④] 총과 권력이 만든 성의 무법지대
중국의 권력 질서는 단선적이지 않았다. 황제가 제도를 만들고, 사대부가 이를 해석하며, 향신이 지역 사회에 적용하는 동안에도, 제도의 균열은 늘 존재했다. 그 균열이 극대화될 때 등장하는 존재가 군벌이었다. 군벌은 법의 산물이 아니었고, 윤리의 결과도 아니었다. 그들은 오직 무력을 통해 권력을 획득했고, 그 ... -

에프스타인 파일 공개… 300만 페이지로 가린 서구 체제의 불투명성
2026년 1월 30일, 미 법무부 차관 토드 블랜치는 에프스타인 사건과 관련된 300만 페이지 이상의 문서와 2000여 개의 동영상, 18만 장에 달하는 사진을 대중에 공개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공개는 2025년 11월 ‘에프스타인 파일 투명성 법안’ 발효 이후 이뤄진 최대 규모의 기록물 공개로 알려졌다. 그러... -

7쌍 중 5쌍은 한족과 결혼… 조선족 사회에 무슨 일이
글|김다윗 중국 내 조선족과 한족 간 통혼이 빠르게 늘고 있다.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조선족의 타민족 혼인 비율은 70% 안팎으로, 전국 소수민족 평균(약 25%)을 크게 웃돈다. 소수민족 가운데서도 이례적인 수치다. 전문가들은 이를 개인의 선택을 넘어, 인구 구조·도시화·문화 적합성이 맞물린 ... -
![[기획 연재 ⑤] 법 바깥의 세계, 강호…범죄와 결합한 성](/data/news/202601/news_1769589935.1.png)
[기획 연재 ⑤] 법 바깥의 세계, 강호…범죄와 결합한 성
황제의 제도, 사대부의 언어, 향신의 관행, 군벌의 무력은 모두 ‘공식 권력’의 스펙트럼에 속했다. 그러나 중국 사회에는 언제나 이 질서의 바깥에 존재한 세계가 있었다. 사람들은 이를 ‘강호(江湖)’라 불렀다. 강호는 단일한 집단이 아니었다. 비밀 결사, 범죄 조직, 유랑 집단, 무장 폭력배, 밀수꾼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