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포투데이] 아파트 몇 층에 사느냐가 정말 건강과 수명에 영향을 줄까. 언뜻 들으면 황당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국내외 연구들에서 거주 층수와 생활습관, 나아가 건강 상태 사이의 연관성이 관찰된 바 있다.
최근 국외에서 발표된 한 장기 추적조사에서는 12년간 도시 거주민을 분석한 결과, 6층 이상에 사는 사람들의 심뇌혈관 질환 발생 비율이 1~3층 주민보다 약 15% 높게 나타났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2천 명 넘는 주민을 조사했을 때, 고층 거주자의 경우 일상적 활동량이 줄고 뼈 건강 지표가 악화되는 경향이 확인됐다. 특히 노년층에서 그 차이가 두드러졌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차이를 단순히 ‘고층 = 단명’으로 해석하기보다는, 거주 환경이 생활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실제로 고층에 살면 외출이 번거롭고 엘리베이터 의존도가 높아져 자연스레 활동량이 줄어든다. 노년층은 이 영향이 더 크다. 환기 조건이 좋지 않고 중앙 냉·난방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호흡기 질환이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지상에서 이뤄지는 가벼운 교류나 햇볕 노출이 줄면서 심리적 고립감이 커질 수 있고, 독거노인에게는 특히 위험 요인이 된다. 화재나 정전, 엘리베이터 사고 같은 돌발 상황에 대한 대응 역시 고층이 불리하다.
그렇다고 해서 고층 거주가 곧바로 건강에 해롭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전문가들은 거주 층수보다 중요한 것은 생활습관이라고 입을 모은다. 하루에 두 번 이상은 꼭 내려가 가볍게 산책하거나 주변을 걸으며 활동량을 늘리고, 집 안에서도 규칙적으로 환기를 시켜 가능한 한 자연풍을 쐬는 것이 좋다. 햇볕을 쬘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신체 리듬을 조율하고, 이웃과의 가벼운 교류를 늘려 정서적 안정감을 확보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즉, 고층 거주 자체가 건강을 위협한다기보다, 그로 인해 줄어드는 활동과 사회적 접촉이 문제라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층수는 단지 주거 선택의 문제일 뿐, 건강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이 아니다”라며 “환경에 적응하고 생활 습관을 조정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결국 수명과 건강을 지키는 힘은 층수가 아니라, 매일의 작은 움직임과 생활 습관에 달려 있다는 얘기다.
BEST 뉴스
-

서울 3년 살며 깨달은 한국의 민낯
영하 12도의 서울. 바람은 칼날처럼 뼛속으로 파고들었다. 나는 홍대 입구에 서 있었다. 움직이는 이불 더미처럼 꽁꽁 싸매고, 온몸을 떨면서. 그때 정면에서 한국 여자 셋이 걸어왔다. 모직 코트는 활짝 열려 있고, 안에는 얇은 셔츠 하나. 아래는 짧은 치마. ‘광택 스타킹?’ 그런 거 없다. 그... -

마두로 체포 이후, 북한은 무엇을 보았나
글|안대주 국제 정치는 종종 사건 자체보다 ‘언제’ 벌어졌는지가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를 전격 체포한 직후,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 일정과 맞물려 북한이 고초음속 미사일 발사 훈련을 공개했다. 단순한 군사 훈련의 공개로 보기에는 시점... -

같은 혼잡, 다른 선택: 한국과 중국의 운전 문화
글|화영 한국에서 운전하다 보면 반복해서 마주치는 장면이 있다. 차선을 바꾸기 위해 방향지시등을 켜는 순간, 뒤차가 속도를 높인다. 비켜주기는커녕, 들어올 틈을 원천 차단한다. 마치 양보가 곧 패배인 것처럼 행동한다. 이 장면은 우연이 아니다. 한국 도로에서는 ‘내가 우선’이... -

“왜 이렇게 다른데도 모두 자신을 ‘중국인’이라 부를까”
글|화영 해외에서 중국을 바라보는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종종 비슷한 의문이 제기된다. 남북으로 3000km에 달하는 광대한 영토, 영하 50도에서 영상 20도를 오가는 극단적인 기후, 서로 알아듣기 힘든 방언과 전혀 다른 음식 문화까지. 이처럼 차이가 극심한데도 중국인들은 자신을 ... -

중국산 혐오하면서 중국산으로 살아가는 나라
중국산을 싫어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다. 그런데 중국산 없이 하루라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한국 사회의 중국산 혐오는 이미 감정의 영역에 들어섰다. “중국산은 못 믿겠다”, “짝퉁 아니냐”는 말은 습관처럼 반복된다. 하지만 이 말은 대부분 소비 현장에서 힘을 잃는다. 불신은 말... -

같은 동포, 다른 대우… 재외동포 정책의 오래된 차별
글 |화영 재외동포 정책은 한 국가의 품격을 비춘다. 국경 밖에 사는 동포를 어떻게 대하는가는 그 나라가 공동체의 경계를 어디까지로 설정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최근 외교부·통일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나온 대통령의 발언은 단순한 행정 점검을 넘어, 재외동...
실시간뉴스
-
서울에서 2년, 드라마가 말하지 않는 ‘한국의 계급’

-
“홍콩 반환, 무력으로 막을 수 있다고 믿었다”…

-
역사 속 첫 여성 첩자 ‘여애(女艾)’… 고대의 권력 판도를 뒤집은 지략과 용기의 주인공

-
백두산 현장르포④ | 용정의 새벽, 백두산 아래에서 다시 부르는 독립의 노래

-
[기획연재③] 윤동주 생가에서 보는 디아스포라 — 북간도 교회와 신앙 공동체의 항일운동
![[기획연재③] 윤동주 생가에서 보는 디아스포라 — 북간도 교회와 신앙 공동체의 항일운동](/data/news/202510/news_1760826949.1.jpg)
-
백두산 현장르포③ | 지하삼림, 천지의 그늘 아래 살아 숨 쉬는 또 하나의 세계

-
백두산 현장르포② | 폭포 앞에서 듣는 사람들의 이야기

-
[기획연재②] 윤동주 생가에서 보는 디아스포라 — 교육·신앙·항일의 불씨
![[기획연재②] 윤동주 생가에서 보는 디아스포라 — 교육·신앙·항일의 불씨](/data/news/202509/news_1759108360.1.jpg)
-
[기획연재①] 윤동주 생가에서 보는 디아스포라 — 문학, 민족, 그리고 기억의 장소
![[기획연재①] 윤동주 생가에서 보는 디아스포라 — 문학, 민족, 그리고 기억의 장소](/data/news/202509/news_1759037552.1.jpg)
-
백두산 현장르포① | 민족의 성산에서 천지를 마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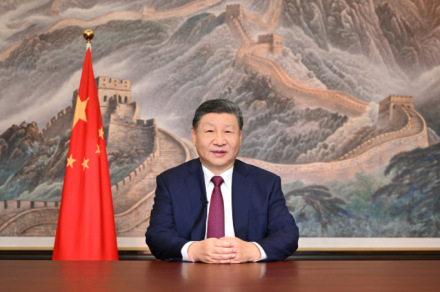
![[단독 인터뷰] 호사카 유지 “다카이치 내각의 대만·독도 발언, 외교 아닌 국내 정치용 전략”](/data/news/202512/news_1766370493.1.jpe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