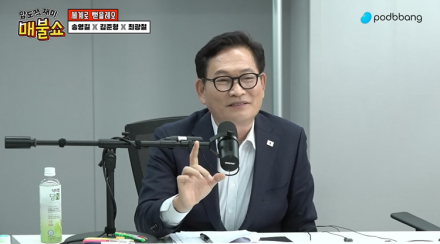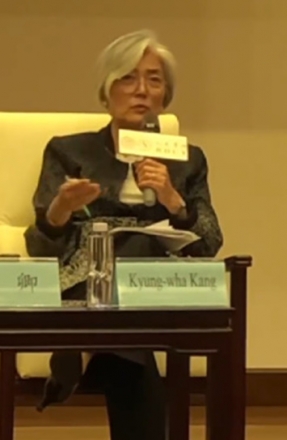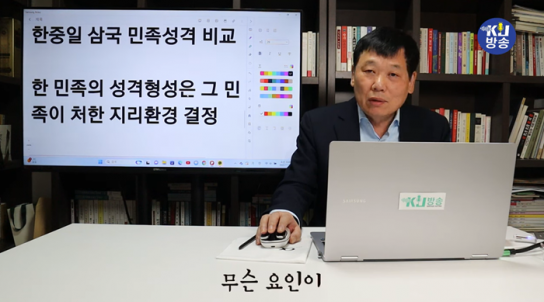- 한국지명과 연변지명(3)
《중국고금지명사전》(中国古今地名辞典) 기록에 의하면 두만강 명칭은 만주어 tumen sekiyen 한자로 图们色禽에서 유래 되었다고 적고 있다. 만주어 tumen sekiyen는 만 갈래 물줄기라는 뜻으로 해석되는데 이를 우리말로 즈믄 (천 혹은 많다의 고어) 샴치(함경도 방언 샘물)라고 풀이 하면 그 해석이 더욱 완벽하다. 수많은 샘물들이 두만강 양안에 모여 있는 까닭으로 이름이 붙여 진 것이다.
두만강 양안에는 말 그대로 샘물들이 하늘의 별처럼 널려 있어 한 겨울에도 많은 구간이 완전히 얼어붙지 않는다. 샘물 따라 물안개 보얗게 피는 곳엔 초가집들이 옹기종기 줄지어 들어 앉아 마을 지명들도 샘물둥지 샘물구파이 우물깨 약수동과 같이 다양하게 불러왔다. 그 가운데 두만강 가에 자리 잡은 삼합진에는 지명이 사물깨라는 동네가 있다. 옛날 이 마을에는 샘 줄기가 있는 바윗돌들이 군데군데 자리해 있어 여러 갈래 샘물들이 사시장철 마르지도 않고 바위 밑에서 솟아 나왔다. 사물깨 마을은 말 그대로 샘물이 주물러 자연 그대로 만들어 놓은 동네였다. 여기에서 사무깨란 말은 우물 샘 (새미)의 받침소리 리을(ㄹ)이 탈락한 것이고 깨는 함경도 방언에서 지점 장소를 뜻한다.
연변 동불사 소재지에서 북으로 십리길 들어가면 사수(泗水)촌이 나타난다. 작은 하천을 끼고 마을들이 이루어 졌으나 강물양이 적어 콧물처럼 흐른다 하여 콧물 사(泗)자를 사용해 지명이 유래 되였다는 설과 이 마을 우물들이 골고루 안물(함경도 방언 뽀얀 샘물)로 되여 콧물 사(泗)자를 사용해 지명이 유래 되었다는 두 가지 설이 있다. 마을 노인들은 가뭄에도 마루지도 않고 뽀얀 우물이 시원하게 솟아나는데 한여름에도 이가 시리도록 차가운 약수 물이었다고 한다.
한국 경상남도 서남부에 사천시(泗川市)라고 부르는 곳이 있다. 역사를 거슬러 사천시 지명을 뒤적여 보면 조선 태종 때에 사천(泗川)현으로 고려 때에 사주(泗州)로 신라 때 사물현(史勿縣)이였던 명칭을 경덕왕이 사수(泗水)현으로 개명 한 것으로 기록 되여 있다. 사실상 사천시의 최초의 지명을 따지고 보면 사물현(史勿縣)으로 되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위에서 언급한 중국 연변 지명과 한국 지명을 바탕으로 사물(史勿)이란 이 지명을 꼼꼼히 캐고 보면 결국 샘물(泉)이란 뜻을 지닌 동음차자(同音借字)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다시 말하면 사물(史勿)은 원래 샘물을 뜻하는 우리 말 <<샴 /새미 >>에 대한 한자음으로의 소리 옮김이고 사수(泗水)는 그것에 대한 뜻 옮김이다. 샘물들이 흘러 내를 이루고 또 내가 흘러 강물이 되므로 샘의 뜻을 지닌 사물(史勿)이란 지명이 사천(泗川) 지명으로 이어 지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를 실마리로 삼아 유사한 地名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추정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연변 부처골 용진마을 사물깨, 북한 장진호 연안 지명 사수(泗水), 전라도 만경강 옛 명칭 사수강(泗水江) 등 지명들도 이런 맥락에서 해독 할 수 있다. 거기에 아득히 먼 고구려 지명 사물택(沙勿泽)과 인명 위사물(位沙勿)도 이와 같은 흐름으로 풀이하여 나갈 수 있다. 여기에서 사(沙)는 사(史)로 바뀌어 졌으나 사(史)와 사(沙)는 같은 음독(音讀)으로서 물(勿)과 함께 묶어 놓고 보면 사물(沙勿)은 샘물을 뜻하는 소리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 글누림에서 출판한<<지명으로 읽는 이민사 연변 100년 역사의 비밀이 풀린다>>에서 화룡에 있는 쓰렁바이 지명을 쓰렁바위로 착각하여 四人岩 四棱岩으로 새기고 인근 옥천동 지명을 충청도 옥천군 옥천동에서 따온 지명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허나 사실 쓰렁바이 지명은 만주어 seri 샘물과 ba 장소를 나타내는 의미로서 샘물터라는 뜻 이다. 옥천동 지명도 샘물로 이름난 이 고장 쓰렁바이 지명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해야 정학한 것이다. 한국어 샘과 만주어 seri는 비슷한 음을 띠고 있다. 한자 표기 된 지명은 사실 이런 의미를 연결시키는 고리 구실을 하고 있다. 지명을 올바르게 해독하려면 이런 한자 지명 속에 구겨 넣은 최초의 말소리를 정확히 찾아 끄집어내야 한다.
연변 지역은 고대로부터 동북아 역사 발전에 중요한 밑거름이 되어 왔으며 발해시기에 들어와 도성이 자리 잡을 만큼 매우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학계에서는 기존 고고학적 기록과 유적에 매달려 조사하고 있을 뿐 이 지역에서 오래 동안 이어온 고유의 문화 이를테면 지명과 방언에 대한 연구는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못한 실정이다. 거기에 많은 마을들이 하나 둘 사라져 가고 현지에 살던 토박이 노인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나가고 있는 오늘날 이에 대한 조사사업은 시급하게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옛날에사 대촌이었지. 인자 성 쌓고 남은 노인들만 남아. 이래가지고 동네가 우찌 될견지 농촌 다 망하는 게라이.」 연로한 할아버지의 한숨석인 독백, 오늘의 연변 농촌 마을에서 가끔 듣게 되는 말들이다.
글 : 허성운
ⓒ 인터내셔널포커스 & www.dspdaily.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서울 3년 살며 깨달은 한국의 민낯
영하 12도의 서울. 바람은 칼날처럼 뼛속으로 파고들었다. 나는 홍대 입구에 서 있었다. 움직이는 이불 더미처럼 꽁꽁 싸매고, 온몸을 떨면서. 그때 정면에서 한국 여자 셋이 걸어왔다. 모직 코트는 활짝 열려 있고, 안에는 얇은 셔츠 하나. 아래는 짧은 치마. ‘광택 스타킹?’ 그런 거 없다. 그... -

마두로 체포 이후, 북한은 무엇을 보았나
글|안대주 국제 정치는 종종 사건 자체보다 ‘언제’ 벌어졌는지가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를 전격 체포한 직후,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 일정과 맞물려 북한이 고초음속 미사일 발사 훈련을 공개했다. 단순한 군사 훈련의 공개로 보기에는 시점... -

같은 혼잡, 다른 선택: 한국과 중국의 운전 문화
글|화영 한국에서 운전하다 보면 반복해서 마주치는 장면이 있다. 차선을 바꾸기 위해 방향지시등을 켜는 순간, 뒤차가 속도를 높인다. 비켜주기는커녕, 들어올 틈을 원천 차단한다. 마치 양보가 곧 패배인 것처럼 행동한다. 이 장면은 우연이 아니다. 한국 도로에서는 ‘내가 우선’이... -

“왜 이렇게 다른데도 모두 자신을 ‘중국인’이라 부를까”
글|화영 해외에서 중국을 바라보는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종종 비슷한 의문이 제기된다. 남북으로 3000km에 달하는 광대한 영토, 영하 50도에서 영상 20도를 오가는 극단적인 기후, 서로 알아듣기 힘든 방언과 전혀 다른 음식 문화까지. 이처럼 차이가 극심한데도 중국인들은 자신을 ... -

중국산 혐오하면서 중국산으로 살아가는 나라
중국산을 싫어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다. 그런데 중국산 없이 하루라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한국 사회의 중국산 혐오는 이미 감정의 영역에 들어섰다. “중국산은 못 믿겠다”, “짝퉁 아니냐”는 말은 습관처럼 반복된다. 하지만 이 말은 대부분 소비 현장에서 힘을 잃는다. 불신은 말... -

같은 동포, 다른 대우… 재외동포 정책의 오래된 차별
글 |화영 재외동포 정책은 한 국가의 품격을 비춘다. 국경 밖에 사는 동포를 어떻게 대하는가는 그 나라가 공동체의 경계를 어디까지로 설정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최근 외교부·통일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나온 대통령의 발언은 단순한 행정 점검을 넘어, 재외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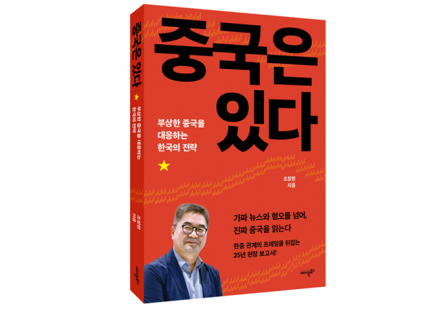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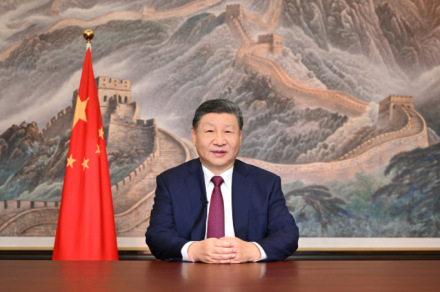
![[단독 인터뷰] 호사카 유지 “다카이치 내각의 대만·독도 발언, 외교 아닌 국내 정치용 전략”](/data/news/202512/news_1766370493.1.jpe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