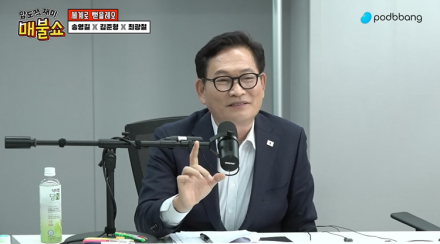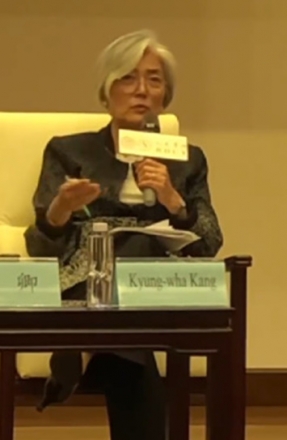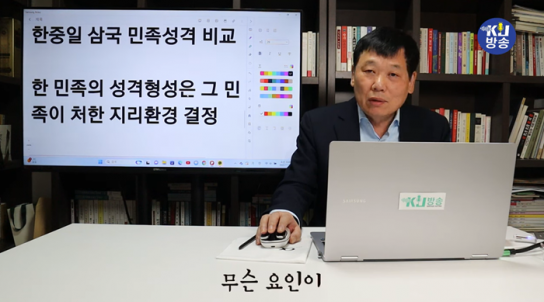[동포투데이]1991년 소련 해체로 냉전 구도가 무너진 뒤, 옛 사회주의권 20여 개 국가가 일제히 체제 전환에 나섰다. 소련 15개 공화국과 폴란드·헝가리·체코·슬로바키아·루마니아·불가리아·알바니아 등 동유럽 국가, 그리고 몽골까지 포함된다. 대부분이 1989~1992년 사이에 계획경제를 포기하고 시장경제와 다당제를 도입했다.
초기에는 공통적으로 ‘충격요법’의 후폭풍이 컸다. 산업 기반 붕괴와 실업 급증, 고(高)인플레이션이 뒤따랐다. 러시아는 1990년대 초 물가가 수십 배 뛰었고, 동유럽 다수 국가는 실업률이 20%를 넘기도 했다. 그러나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상당수 국가의 경제가 회복 궤도에 올랐고, 이후 30여 년 사이 각국의 발전 속도는 뚜렷하게 갈렸다.

EU 편승한 동유럽, ‘전환 성공 사례’로 부상
동유럽 국가는 EU 가입을 계기로 가장 빠른 변화를 이뤄냈다. 폴란드·헝가리·체코·슬로바키아는 2004년, 루마니아·불가리아는 2007년 EU에 합류하며 서유럽 시장과 제도에 편입됐다.
폴란드는 인구·경제 규모를 바탕으로 ‘전환국가 최대 수혜국’으로 평가받는다. 2024년 GDP는 8천억 달러, 성장률은 3%대 중반을 유지한다. 실업률은 3% 수준으로 낮지만, 젊은 층의 서유럽 유출과 빠른 부동산 가격 상승은 부담 요인이다.
헝가리는 자동차 산업 중심의 수출경제로 2024년 GDP 2,100억 달러, 인구 대비 GDP 3만 달러 중반을 기록했다. 다만 높은 인플레이션과 EU 보조금 문제 등 정치·경제적 갈등 요소가 상존한다.
체코와 슬로바키아는 1993년 분리 이후 각자 산업 구조를 강화하며 성장했다. 체코는 1인당 GDP 4만 달러 후반, 슬로바키아는 3만 달러 중반을 기록하며 EU 내 중견 경제로 자리 잡았다. 루마니아·불가리아·알바니아는 여전히 추격 단계지만 인프라와 서비스 산업 확대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몽골은 자원 의존도가 높지만 광물 수출 증가에 힘입어 2024년 5% 성장률을 기록했다. 다만 도시 환경 악화와 양극화 문제는 여전히 뚜렷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벨라루스, ‘자원 의존·지정학 리스크’에 흔들린 전환
옛 소련의 핵심이었던 러시아·우크라이나·벨라루스는 체제 전환 과정에서 가장 큰 진통을 겪었다.
러시아는 2024년 GDP 2조 달러로 전환국 중 최대 규모지만, 경제 구조가 여전히 에너지 수출 의존적이다. 1990년대 급격한 민영화는 과두 체제를 낳았고, 최근까지도 지역 양극화와 통화 불안이 문제로 지적된다.
우크라이나는 2010년대 이후 농업 강국으로 부상했지만 2022년 이후 전쟁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졌다. 2024년 GDP는 2천억 달러, 실업률 12%, 인플레이션은 두 자릿수에 머물렀다.
벨라루스는 제조업 기반이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정치적 폐쇄성과 러시아 의존도가 높아 제재와 경기 변동에 취약하다.
반면 발트 3국(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은 전환 성공의 대표 사례로 꼽힌다. 2004년 EU·NATO 가입 이후 디지털 행정과 첨단 산업 육성으로 소득 수준이 러시아를 뛰어넘었다. 다만 고령화와 소수 러시아계 주민의 사회 통합 문제는 과제로 남는다.
중앙아시아·남캅카스, 자원 의존과 지정학의 그늘
중앙아시아 5개국(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은 자원·노동 송금에 크게 의존하며 전환 속도가 더뎠다. 카자흐스탄은 석유 덕분에 가장 높은 소득 수준을 유지하지만, 투르크메니스탄·타지키스탄 등은 여전히 저소득 국가군에 속한다.
남캅카스 3개국(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조지아)은 에너지·관광·광업 등 산업 특성이 뚜렷하지만 영토 분쟁과 정치 불안이 발목을 잡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30년의 결산… 평균적으론 ‘성장’, 현실은 ‘양극화’
1990년대 초반 심각한 경기 침체를 겪은 뒤, 전환국 전체 경제 규모는 2024년 기준 5조 달러를 넘어서며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빈곤율은 1990년대 40%에서 현재 15% 안팎으로 낮아졌고, 평균 기대수명도 10년 이상 늘어났다.
그러나 소득 불평등·부패·지역 격차 등 구조적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 일부 국가는 높은 기술 역량과 외국 자본 유치로 서유럽 수준에 접근한 반면, 또 다른 국가는 자원 편중·정치 불안·이주 노동 의존으로 정체를 겪고 있다.
전문가들은 “체제 전환이 곧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며 “시장 개방, 제도 개혁, 외부 환경 등 복합적 요인이 국가별 격차를 키웠다”고 분석했다.
BEST 뉴스
-

젤렌스키 “러시아, 중국에 주권 양도”… 중·러 이간 시도 논란
[인터내셔널포커스]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를 겨냥한 발언을 내놓아 파장이 일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지시간 12월 10일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러시아가 일부 주권을 중국에 넘기고 ... -

트럼프 행정부, 그린란드 확보 방안 논의…군사적 선택지도 거론
[인터내셔널포커스]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덴마크령 그린란드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며, 이 과정에서 군사적 선택지까지 논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공영 방송 CCTV는 7일 보도를 통해, 현지시간 6일 한 미국 고위 관료의 발언을 인용해 도널드 트럼... -

비행기 타본 적 없는 중국인 9억 명, 왜?
[인터내셔널포커스] 중국 민항 산업이 고속 성장을 이어가고 있지만, 중국인 9억3000만 명은 아직 한 번도 비행기를 타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여객 수가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항공 이용의 ‘그늘’이 여전히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베이징 베이징 다싱 국제공항과 상하이 상하이 ... -

러 공군 초대형 수송기 An-22 공중 분해 추락… 승무원 7명 전원 사망
[인터내셔널포커스] 러시아 공군의 초대형 군용 수송기가 훈련 비행 도중 공중에서 두 동강 나 추락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사고 기체는 냉전 시기 소련 항공 기술의 상징으로 불리던 안토노프 An-22(나토명 ‘콕·Cock’)로, 탑승 중이던 승무원 7명 전원이 숨졌다. 러시아 측 발표에 따르면 사고는 현지... -

중국 희토류 카드 발동 임박…일본 경제 흔들
[인터내셔널포커스] 중국 정부가 일본을 겨냥해 중·중(中重) 희토류 관련 품목의 수출 허가 심사를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6일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일본의 대중(對中) 외교 행보를 고려해 2025년 4월 4일부터 관리 대상에 포함된 중·중 희토류 관련 물... -

“대만을 전쟁 위기로” 라이칭더 향한 탄핵 성토
[인터네셔널포커스]대만 내에서 라이칭더를 겨냥한 탄핵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라이칭더가 대만 사회의 주류 민의를 외면한 채 ‘반중·항중(抗中)’ 노선을 강화하며 양안(兩岸) 관계를 급격히 악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대만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시민들은 “라이칭더가 대만 사...
NEWS TOP 5
실시간뉴스
-
BBC, ‘마두로 납치’ 표현 사용 금지 지침…편집 독립성 논란

-
로마서 수백 명 반미 시위…“미, 베네수엘라 군사 개입 중단하라”

-
스위스 스키 휴양지 술집 폭발·화재… 수십 명 사망, 100여 명 부상

-
논란에도 매장엔 인파… 프랑스 성탄 쇼핑가 휩쓴 중국 제품

-
런던 도심 시위서 연행된 기후운동가… 반테러법 적용 논란

-
징둥 프랑스 물류창고 도난…3,700만 유로 전자기기 피해

-
마크롱, 러시아 동결 자산 활용서 ‘메르츠와 결별’… 베를린은 충격

-
“술로 근심 달래는 유럽 외교관들… 서방 동맹은 끝났다”

-
“스타머, 틱톡 전격 개설… 방중 앞두고 ‘민심 잡기’?”

-
EU 고위관료 “중국에 안 먹히면 ‘무역 핵무기’까지 동원할 것” 경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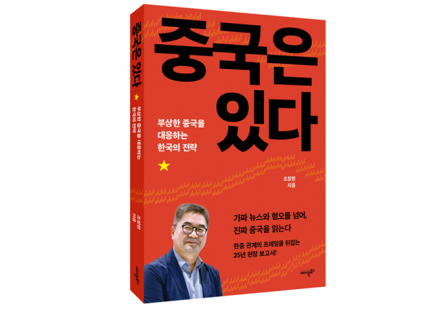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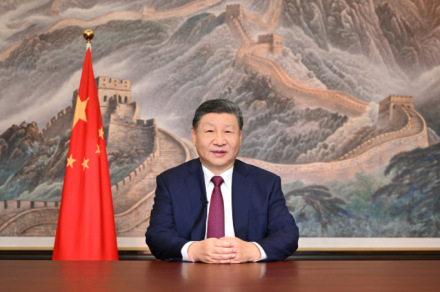
![[단독 인터뷰] 호사카 유지 “다카이치 내각의 대만·독도 발언, 외교 아닌 국내 정치용 전략”](/data/news/202512/news_1766370493.1.jpeg)